






日本國 最高裁判所
일본 재판소 사이트
일본국 헌법 |
하급재판소의 설치 등에 관해서는 '재판소법(裁判所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
그 하위 법률로 '하급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下級裁判所の設立及び管轄区域に関する法律)'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일본의 재판소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법원보다 권한범위가 협소하다. 가족관계등록, 공탁은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법무성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국헌법 |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응되는 사법부의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비롯해 어느 나라나 대법원은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하기에 제법 보수적이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말 보수적이기로 악명(?)이 높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비해 위헌 재판이나 위헌 결정을 한 예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 중 하나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일본국 헌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단 10번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은 9차 헌법 제정 이후 30여 년 간 위헌 결정만 543번 이루어졌다.
최고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최고재판소장'이 아니고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이다. 장관이라니까 뭔가 말이 이상해 보이지만, 원래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응하는 것은 대신(大臣)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 일본도 최고재판소의 소속기관으로 사무총국(事務総局), 사법연수소(司法研修所),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 최고재판소도서관(最高裁判所図書館)을 두고 있다.
최고재판관의 정년은 70세까지이며, 임명된 뒤 처음 치뤄지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받는다. 파면에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가 되면 파면당하게 된다. 이 심사는 받은 뒤 십년이 지날 때마다 중의원 총선거와 함께 다시 받게 된다. 이 제도로 파면당한 재판관은 아직 없다.
일본법상 하급재판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에 대응한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 대한민국의 특허법원에 대응한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知的財産高等裁判所設置法)'에 따라 토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의 지부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에 대응한다.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 -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 대응한다.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 - 대한민국의 시ㆍ군법원에 대응한다.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의 각급 법원(시ㆍ군법원 제외)의 장의 직명이 '법원장'인 것과 달리, 일본 고등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고등재판소장관'(高等裁判所長官)이다. 다만, 일본도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의 장은 각각 '지방재판소장(地方裁判所長)', '가정재판소장(家庭裁判所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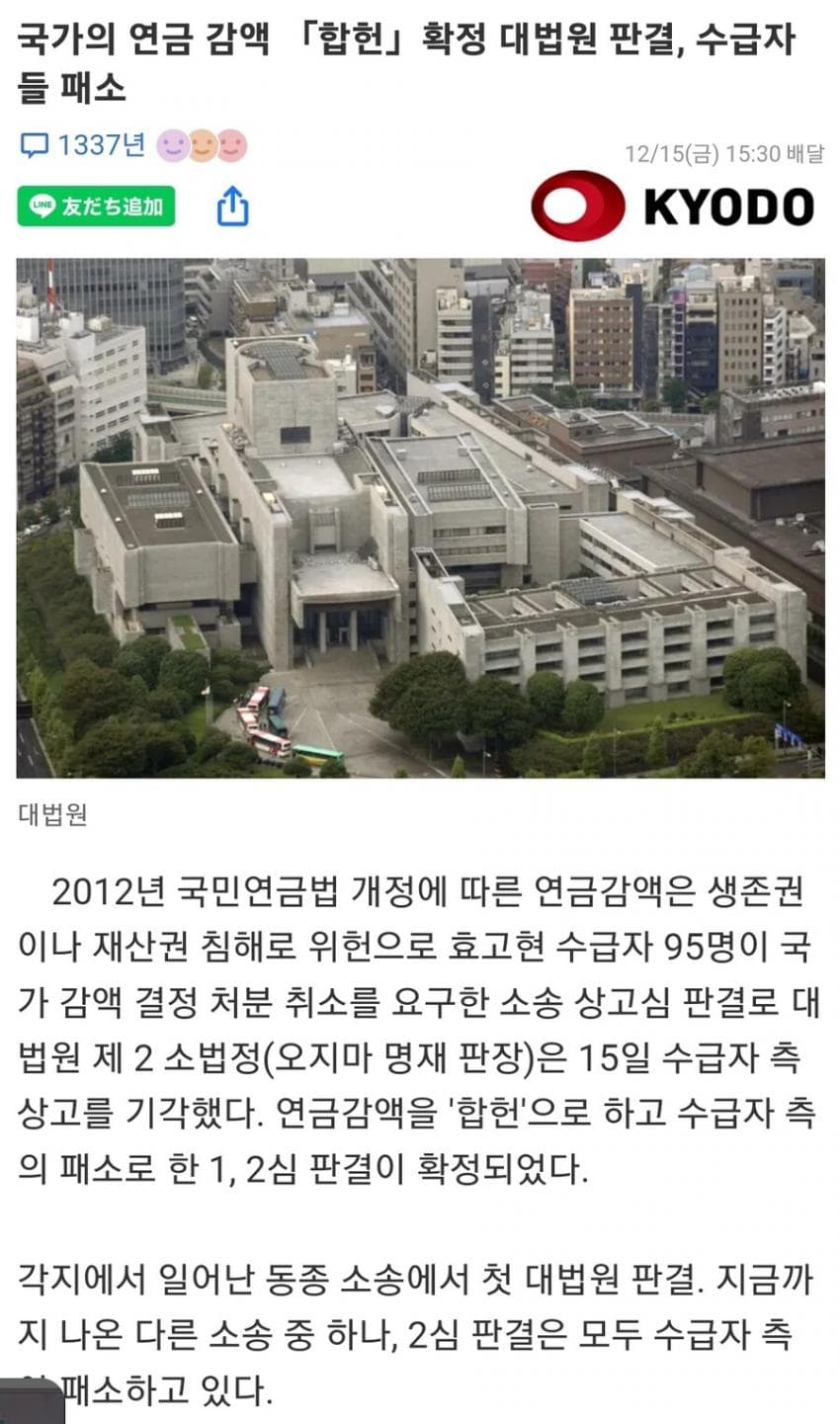
'건축물 > 정부 청사 관공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쿄 자치청사 (동경시청) (0) | 2020.04.22 |
|---|---|
| 도쿄 구치소 (0) | 2020.03.03 |
| 일본 법무성 (0) | 2020.03.01 |
| 러시아 연방 외무부 청사 (0) | 2020.02.13 |
| 일본 도쿄 경시청 (동경) (0) | 2020.01.03 |
